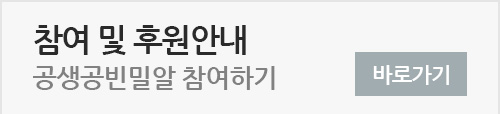케냐 나이로비를 출발한 경비행기가 큰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맨땅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나는 3주간의 첫 아프리카 방문이 내게 무슨 의미가 될지 알지 못했다. 가슴에 뜨거운 바람을 남겼던 이태석 신부님의 톤즈 이야기와 음악으로만 가득 찼던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목마름이 마침 지인 신부님이 선교사로 계신 남수단의 '아강그리알'이라는 시골로 운 좋게 나를 이끌었고 그저 어떤 일이든 해볼 각오가 돼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달라는 신부님들 요청은 땀 흘리는 일을 기대했던 내게 적잖은 실망을 주었지만 이는 곧 그곳 아이들과 가깝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운으로 급변했다.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 하나를 건반으로 연주해 보이고 도레미파를 가르쳐주었더니 금세 멜로디언의 흰 건반을 연습하는 굳은살 박인 까만 손가락들에 신이 났다. 어쩌면 아이들이 좋아한 건 새로운 장난감 멜로디언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신부님들이 내게 부탁한 일이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을지 모르는 것처럼.
케냐에서 모셔오는 학교 선생님들은 개학한 지 몇 주가 지났어도 자국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사랑이 많아 아이들이 잘 따르는 한국 신부님들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볕의 타국에서 성당 건축으로 바빴다. 아프지 않아도 관심받고 싶어 진료소에 온다는 의료봉사자의 말처럼 아이들에게도 눈 맞추고 이야기하며 살 닿을 사람이, 사랑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때마침 열린 음악교실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참 좋은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매번 일찌감치 날 찾아와 당장 시작종을 치게 해달라 졸랐고 끝나도 도무지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길을 가면서도 신나게 계명창을 불러 나를 흐뭇하게 했다. 악기가 부족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아이들과 뒹굴고 나면 그 땟국물이 비누칠 한 번으론 어림도 없었는데, 부어주고 나면 내 맘을 다시 잔뜩 채워주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사랑에 씻어낼수록 고마운 검정물이었다.
그런데 이 넘치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치면 (하루에 백 번을 달려들어도) 예쁘기만 하던 아이들이 귀찮아졌고 그들의 실망하는 눈엔 '내가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날 좀 잠시 가만히 안 두니' 하는 생색의 짜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엔 가만히 그늘에 앉아 더위가 지나가길 기다릴 줄 알았던 이들과는 달리 쉬는 방법도 잘 모를뿐더러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불안감에 몸을 혹사해버리고 마는 내 사는 방식과 속력은 결국 사랑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됨을 깨달았다. 마음 한 구석을 늘 비워두는 지혜와 연습이 없으면 금방 원망과 생색으로 돌변해 상처가 되는 것이 사랑임을. 그러니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는 우리의 허겁지겁 바쁜 세상에서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인지.
그렇게 아이들은 내게 음악을 배웠고, 나는 아이들 템포에 맞춰 천천히 살며, 사랑하기에 알맞은 리듬 찾기를 연습했다. 내게 생각지 못한 사랑을 안겨준 것도 부족해, 많을 걸 가져서 우매해진 이 문명인에게 새 걸음마 연습도 시켜주고 거기에 바쁜 세상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도 가르쳐 보태준, 그것이 아프리카가 내게 준 3주간의 선물이었다.
떠나는 나에게 "우리는 절대 울지 않지만 지금은 상당히 행복하지 않다"던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묻는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내게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이 되었을까? 늘 그렇듯 사랑은 언제 어디서 올 거라고 전보도 치지 않고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