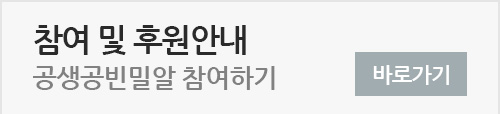"그리스도교 문화에서 나고 자라지 않아 그 이해가 부족할 당신의 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데뷔 시절, 오리토리오 등 각종 종교음악을 노래할 때 종종 듣던 질문이다. 말은 저렇게 예의를 갖췄어도 속으로는 나를 자신들의 음악을 잘 흉내 내는 재주 좋은 앵무새쯤으로 여기고 있었을지 모른다. 생각보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내가 동양인이니 당연히 불교인일 거라 믿고 이 질문을 던졌을 테고 내가 가톨릭일 줄은, 더구나 성사생활을 하는 신자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만 나는 이를 굳이 말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제법-신앙인'이었지만, 내 기대와 달리 텅텅 빈 성당들과 이들의 대화 안에 종종 유머나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유럽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 열심한 신앙인을 그다지 '쿨(cool)'하지 않은 사람으로, 케케묵은 구식으로까지 여기는 이곳 문화에 충격을 받아 내 신앙도 사춘기를 겪고 있었으므로.
이성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이들의 사고는 신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는 교회의 아픈 역사가 곧 자신들의 역사이기도 했던 그 세월이 단련시킨 비판의식에서 나온 것이리라.
나는 '쿨한 사람'이고 싶었다. 내 직업이 이들 문화의 한 부분이니 이들의 방식에 잘 적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가피한 일이라 여기며, 신자인 것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는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쿨하게 행동했고 늘 쿨하게 웃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야 문득, '나에게 좋았던 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뒷전으로 물려놓았을까' 하는 물음이 들었고 나는 당장 이 '진짜-앵무새-놀이'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 첫걸음이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성호를 '잘' 긋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엔 모두 놀라 순간 식사를 멈추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가톨릭이냐 물었다. 그렇다고만 '쿨'하게 답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다음 식사 때가 되자 내가 기도를 끝낼 때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려주는 이들이 생겼다. 또 누군가는 리허설 중 짬이 날 때 내게 조용히 와서 자기도 어렸을 적엔 성당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다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된 이런저런 속사정을 털어놓았다.(모두 자비의 하느님보다는 심판의 하느님을 강조했던 교회를 위로보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 다음 식사에선 나 말고도 식사 전에 성호를 긋거나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침묵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물론 지금은 모든 동료가 내가 신자임을 알고 이를 자연스레 생각할 뿐 아니라, 리허설이나 공연 시간을 피해 주일미사를 찾는 나를 기꺼이 따라나서기도 한다.
나는 이를 내가 체험한 '성호경의 기적'이라 부른다. 나는 단지 식사 전에 성호를 그었을 뿐이었다. 확신에 찬 신앙인과는 거리가 멀고 난 그저 그 길이 궁금한 사람이기에 신자라고만 밝혔을 뿐 어떤 선교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호경이 물꼬를 튼 인간관계에는, 난 괜찮다던 그 '쿨함'이 점차 사라지고 진솔함이 생겨났다. 진솔함이 싹트자 서로 '쿨하던 시절'에는 줄 수 없었던 위로와 기쁨의 나눔도 그 질이 달라졌다. 그리하여 동료로 만난 이들과 이내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일도 생겼다. 그리고 우린 서로에게 진정으로 '쿨'해져 갔다.
마침내 나는 무대 위에서 이 친구들과 만나 지저귀는 즐거움을 얻은 행운아가 되었고, 그 건너편에는 이 작은 동양인 소프라노가 불러 더 이색적으로 들리는 종교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갔다. 그리고 이젠 아무도 묻지 않는다. "내 노래가 어떻게 자기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