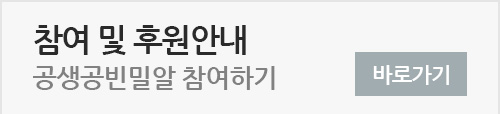도서관·미술관서 나를 찬미하라
그 어떤 이와도 비교 불가한
나란 사람을 추앙하라는 얘기다
용맹한 호랑이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게 진짜 자존감이다
![[공감+] 내가 있는 공간은 나를 보여줍니다](https://img.khan.co.kr/news/2023/09/14/l_2023091501000430700048312.jpg)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오, 강남!” 하는 서초 한복판에 살았어도 아이는 늘 가난했다. 100평 펜트하우스에 사는 친구 집에 다녀오면 더 가난해졌다. “엄마, 우리는 언제 이사 가?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해!” “그렇지 않다”고,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한다”고 타일러도 아이의 쪼그라든 자존감은 펴지지 않았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상대적 박탈과 결핍이 가장 심한 지역일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론 상당히 부유하다고 인식되는 곳이기에 외부의 시선과 내면의 자각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존재했다. 그러니 유난히 큰 혼돈 속에 괴로울 수밖에.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자존감 바닥에서 헤매게 된다. 할부로 산 명품에 알량한 자존감을 의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의 취약을 물건이 채워줄 리 없다. 기죽은 아이와 나를 구원한 것은 공간이었다. 좋은 공간, 아름다운 공간, 바로 도서관과 미술관. 우아해 보이고 젠체하려고 그런 공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들었다는 게 맞겠다. 도서관 책들 속에서 나를 위한 문장들을 찾아냈고, 미술관 그림들 앞에서 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해냈다. 문장도 그림도 꾸밈없이 담백했고, 그 자체로 온전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을 향유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 정말 특별하다! 너무 멋지지 않니?”
아이와 그런 대화도 참 많이 했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는 정신을 고양시켜주는 곳이었다. 미술관은 그림만 보는 곳이 아니라 조급한 생의 속도를 늦춰주는 곳이었다. 다행히 아이와 나는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로 씩씩해졌다. 내가 못 가진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했고 긍정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면 어디서도 예쁜 구석은 찾아지기 마련이다. 일상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사람은 그 존재 또한 보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