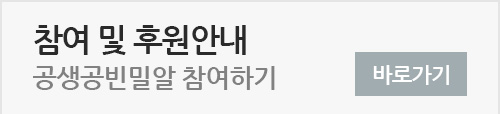덜 쓰고 덜 버리기 / 법정스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옛말이 있다.
요즘 쓰레기 종량제를 지켜보면서 이 말이 문득 떠올랐다.
사람이 만들어 낸 쓰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치여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해답은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우리 혼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행위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현상이 인과법칙이요, 우주의 조화다.
야생동물은 자신들이 몸담고 사는 둥지나 환경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문명하고 개화했다는 사람들만이 자기네의 생활환경을 허물고 더럽힌다.
일찍이 농경사회에서는 쓰레기란 것이 없었다.
논밭에서 나온 것은 다시 논밭으로 되돌려 비료의 기능을 했다.
산업사회의 화학제품과 공업제품이 땅과 지하수를 더럽히고
우리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언젠가 광릉수목원에 갔더니,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의 썩은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었다.
양철 깡통이 다 삭아 없어지려면 1백 년이 걸리고, 알루미늄 캔은 5백 년,
플라스틱과 유리는 영구적이고, 비닐은 반영구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허옇게 굴러다니는 스티로폼은 1천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이다.
또한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 시대에 와서 말할 수 없이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 삶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우리 선인들은 밥알 하나라도 보리지 안고 끔찍이 여기며 음덕을 쌓았는데,
그 후손인 우리들은 과소비로 인해 음덕은 고사하고 복감할 짓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과소비와 포식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이 아닐 흔히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한낱 물건의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소비자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인가,
사람이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존재에 불과하다니,
그러면서도 소비자가 어찌 왕이 수 있단 말인가.
현재와 같은 대량 소비 풍조는 미국형 산업사회를 성장모델로 삼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자원과 기술은 풍부하지만 정신문화와 역사적인 전통이 깊지 않은 그들은 본받다 보니,
오늘과 같은 쓰레기를 양산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맙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아름답게 여기 줄 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