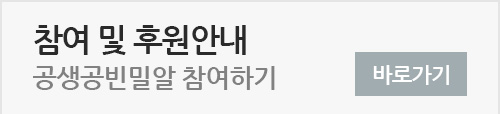농업 6차산업화가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이름을 바꾼 지 10년이다. 2014년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에 따라
정책용어로 일반화됐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아직도 ‘농업이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표현에 익숙하다.
6차산업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에 일본 도쿄대학교 이마무라
(今村奈良臣) 교수가 만들었는데, 그는 마을만들기 강연을 다니면서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전력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즉 농업 생산(1차산업)에 농산물의 가공(2차산업)과 유통·판매(3차산업)를
연계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2차+3차=6차’ 덧셈보다는 ‘1차×2차×3차=6차’ 곱셈 방식의 유기적
결합이 효과가 크다고 봤다. 또 그는 농업이 쇠퇴하면 ‘0×2×3=0’이 되므로
6차산업화의 도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6차산업화의 개념은 2000년대 들어 국내 농정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시장개방 영향으로 농업 수익성이 감소하는 데다 농촌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추세이므로, 6차산업화는 농촌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화두가 됐다. 정부는 6차산업 범위를 농어촌관광분야까지 확장하고,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융복합산업’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됐다. 농업 6차산업화의 공식 명칭은 농촌융복합산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법’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 식품 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즘 후계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영농창업을 위한 농장 설계에 농촌융
복합산업으로 방향을 정하는 사례가 많다. 중견농업인들도 기존의 농산물
생산에 가공부문을 연계하는 농장리모델링을 계획한다. 농식품 가공·유통
사업을 신사업으로 도입하는 농업법인들도 늘어나 우리 농업이 융복합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농촌융복합
사업체들을 보면, 농업 생산보다 가공·유통·관광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도 2·3차산업화를 위한 시설자금이 많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시설업자 배 불리는 정책’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농촌융복합산업 보완정책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후방산업을 포함해야 한다. 농업 가치사슬은 ‘후방산업→원물 생산
→전방산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후방산업에 소홀하다. 따라서 농업인이
참여하는 육묘·부산물비료·농자재 등의 생산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농업 생산에 기반하는 융복합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
초기에는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2차×3차+1차’ 방식을 추구했더라도, 인증
갱신 시에는 반드시 농업 생산과 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농촌융복합산업화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증경영체가 영농조직을 형성하고 지역농업의 리더로
역할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정책이 10년이 된 만큼 성과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이 얼마나
활력을 얻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농업 없이는 6차산업화도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지역농업과 융복합하는 경영체들이 튼실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