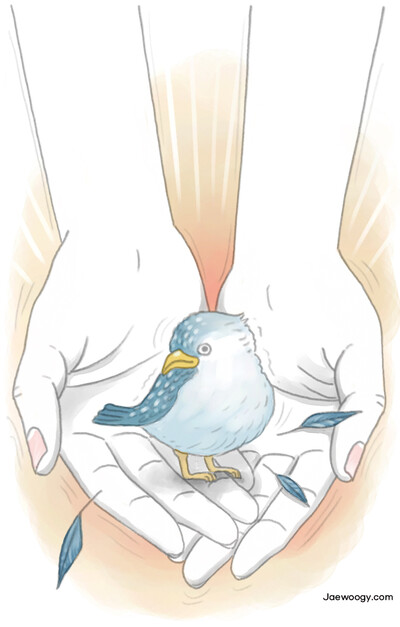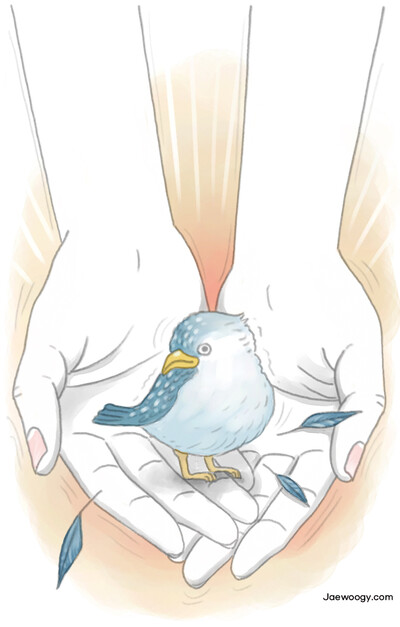우리나라에서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한해 800만마리가 넘고, 하루 평균 2만마리 이상이라고 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인공물로 이토록 많은 살상을 계속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걸까. 태곳적부터 새의 것이었던 나무와 숲을 없애고 유리창 달린 집과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그네들을 죽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강맑실|사계절출판사 대표에 부딪는 햇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아. 유리가 훤히 다 비치니까 새들은 유리벽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신나게 날다가 머리를 부딪치고는 떨어지지. 거기선 발에 밟히는 게 머리가 깨져 죽은 새들이야.”오정희 선생의 소설 “새”에 나오는 구절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열두살 우미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다. 우미의 아버지는 건설현장 노동자로 벽과 지붕이 온통 유리로 된 커다란 교회를 짓고 있었다.이 책을 처음 읽은 건 1990년대 후반쯤이었다. 나는 소설에서 이 대목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미 동생 우일이는 새처럼 날고 싶어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뚝뚝 떨어지곤 했다. 우일이가 2층에서 떨어져 결국 머리를 다쳐 죽어갈 때, 나에게 그 모습은 한마리의 새였다. 새는 내 머릿속에서 우일이로 인격화되었다.이 충격이 점점 희미해질 무렵, 우일이를 다시 소환해낸 사건이 있었다. 2003년 심학산 자락 파주 사옥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층계를 오르다 보니 2층 데크 구석에서 딱새 수컷 한마리가 바들거리고 있었다. 양면이 유리로 된 3층 연결 통로 한쪽 유리벽에 부딪힌 것이다.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버드나무 숲이 있다. 버드나무 숲은 딱새에게 죽음의 덫과 함정이 되었다. 입으로 피를 흘리던 새는 곧 숨을 거뒀다. 손바닥에 올리니 “바람 한줌 얹힌 것”처럼 가벼웠다. 그 뒤로도 2층 데크에서는 노란 꾀꼬리도, 커다란 멧비둘기도, 작은 참새도 떨어져 죽었다. 유리창에 독수리와 매를 그려 붙여놓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때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우일이의 웅얼거림을 들어야 했다. 죽은 새는 우일이었고, 나는 우일이를 죽음으로 내몬 우일이 아버지였다.새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간다. 저공비행을 할 때면 달리는 차의 유리창에 부딪혀 죽고, 모처럼 풀숲에 앉아 쉬노라면 느닷없이 달려들어 죽을 때까지 희롱하는 고양이와 개의 사냥감이 된다. 수천㎞ 먼 길을 떠났다 돌아와 낟알을 주워 먹으며 원기를 회복하던 습지와 논은 도로나 산업단지로 변해버려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 죽는다. 서식지인 산과 숲은 헐리고 고속도로 옆에 만들어진 거대한 방음벽, 그 투명한 벽에 돌진해 죽는다. 끝없이 늘어나는 건물과 주택의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인간이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 만든 유리창이 새들에게는 죽음의 벽이 되었다. 날기 위해 뼈를 가볍게 한 새들의 두개골 두께는 1㎜ 남짓이고 뼛속은 비어 있어 시속 30㎞에서 70㎞로 날아가다 유리창에 부딪히면 달걀이 바위에 던져지는 충격으로 온몸이 깨져 죽는다.새의 눈은 몇몇 맹금류를 제외하고는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 측면에 붙어 있도록 진화해왔다. 그래서 정면의 유리창을 보기도 어렵거니와 유리창과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다. 유리창 건너편에 숲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 유리창으로 거침없이 날아간다. 유리창에 비친 하늘과 나무를 향해 돌진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한해 800만마리가 넘고, 하루 평균 2만마리 이상이라고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8년에 발표한 수치다. 50년 동안 지구상의 새 개체 수는 40% 이상 사라졌다.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인공물로 이토록 많은 살상을 계속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걸까. 태곳적부터 새의 것이었던 나무와 숲을 없애고 유리창 달린 집과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그네들을 죽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유난히 ‘글라스킬’이 많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대도시는 일찍이 새와 공존할 수 있는 ‘버드시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도시를 바꾸는 새>에서 저자 티머시 비틀리는 여러 도시의 사례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새에게 안전한 건축물 규제를 만든 샌프란시스코의 ‘조류 안전설계 표준’에는 유리창과 외벽 설치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다. 세계 여러 도시가 이를 따라 하고 있고,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새를 위한 건축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구로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했고, 환경부 역시 2019년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해 국립생태원과 조치 이행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처럼 건축 관련 법안으로까지 규정되지 않으면 실행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문제는 이미 만들어놓은 방음벽과 건물의 유리창이다. 대표적 사례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이화여대 복합단지캠퍼스(ECC)다. 이 거대한 건물에서 지평면보다 낮은 광장인 성큰(sunken)은 ‘새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새들이 성큰 바닥에 먹이를 찾으러 내려갔다가 양쪽에 설치된 커튼월 유리와 금속 외장재에 반사된 빛 때문에 벽에 부딪히거나 올라오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다. 이 대학 소모임 ‘윈도우 스트라이크 모니터링’은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설치물이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성큰 상부에 망을 설치해 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쪽은 설계한 건축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약과 디자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사람과 달리 조류는 자외선 파장을 볼 수 있기에 유리창에 자외선을 반사하는 테이프를 부착하면 새들은 유리를 사물로 인식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가로 10㎝, 세로 5㎝ 이하의 점 문양을 응용한 스티커나 필름(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을 유리창에 붙이거나, 아크릴 물감으로 직접 점을 찍는 방법이다. 새들은 점 안의 공간을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해 부딪히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고속도로 대규모 방음벽에 점 문양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방음벽 밑에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던 새들의 사체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우리 회사의 3층 연결 통로 양쪽 유리벽에도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인 지 오래다. 점 문양 스티커는 신기하게도 안에서 바깥 경관을 볼 때 전혀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스티커 부착 뒤론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노을빛이 남아 있는 어스름한 저녁, 반려견 보리와 산책할 때면 종종 마을 앞산에서 “우∼ 우, 우∼ 우” 수리부엉이 소리가 들린다. 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서 그 신령한 소리에 빠져 있노라면 보리도 귀를 쫑긋 세우고 조용히 기다린다. 우리 마을 지산리에도 이제 곧 뻐꾸기들이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검은등뻐꾸기는 “어절씨구~ 저절씨구~” 네박자 노래를 부르며 새벽부터 바삐 움직이는 농부들의 일손에 추임새를 넣으리라. 올해도 그네들의 안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