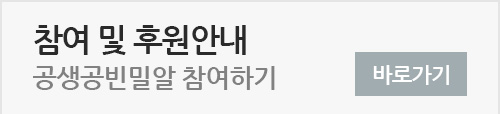이종규 | 논설위원
지난해 여름 우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파국적 재앙의 예고편을 목도했다. ‘펄펄 끓는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살인적인 폭염이 지구촌 곳곳을 덮쳤다. 북미 지역에서만 수백명이 폭염으로 숨졌다. 시베리아 북극권 지역도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다. 고온건조해진 기후 탓에 북미 서부, 시베리아, 남유럽 등에서 초대형 산불이 잇따랐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200년 만의 폭우로 200여명이 숨졌다. 한쪽에선 홍수가, 다른 쪽에선 최악의 가뭄이 인간의 삶을 위협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극한 기상 현상이 한달 사이에 발생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기후 재난이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었음을 절감했다. ‘기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졌다. 현실 정치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도 나왔다. ‘기후 총선’으로 불린 독일과 노르웨이 총선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치러진 독일 총선에선 극우 정당을 뺀 5개 주요 정당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등 전향적인 기후 공약을 내놓았고, ‘기후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녹색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함께하는 ‘신호등 연정’이 탄생했다. ‘신호등’은 세 당의 상징색이 각각 빨강(사민당), 초록(녹색당), 노랑(자민당)이라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세 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탈석탄’ 시점을 기존의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2022년 말 탈원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이 연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같은 달 치러진 노르웨이 총선에서는 석유 시추와 생산 중단이 주요 쟁점이 됐다. 노르웨이는 세계 15위의 산유국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출의 40%가량이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선거 결과 5개 정당의 좌파 연합이 승리했는데, 5개 정당 중 3곳이 석유 생산 중단을 공약했다. 결국 석유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주장하는 2개 정당으로만 연정이 꾸려졌지만, ‘석유 부국’ 유권자들이 부의 원천인 석유 생산 중단을 내세운 정당들을 적잖이 지지했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하다.
정치가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후 불감증’이 여전하다. ‘사생결단’의 대선 공론장에서 기후 이슈는 실종 상태에 가깝다. 유세 연설에서 ‘기후’는 금칙어가 된 듯하다. TV 토론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이뤄진 TV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주제(6개)에 ‘기후’는 끼지도 못했다. 환경운동단체들이 간절히 바랐던 ‘기후 대선’은 언감생심이다.
선거 공약을 봐도 마찬가지다. 주요 후보 가운데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1순위로 올린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 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공약한 후보도 심 후보밖에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감축 목표를 오히려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을 불렀다. 3년마다 진전된 감축 목표 제출을 요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성격상 하향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8월, 온실가스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한다면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2018년 전망보다 도달 시점이 10년가량 앞당겨졌다. 1.5도는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으면 지난해 여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 재앙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심각한 위기 경고)”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기후 과학자들은 ‘1.5도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다고 경고한다. 2027년까지 국정을 이끌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라”고 일갈했다.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라는 충고였다. 기후위기를 ‘발등의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 정도로 여기는 듯한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7년 가운데 5년을 허비한다면 ‘기후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